
< 1 >
평등은 누구도 실현할 수 없었다. 패자들.
정치 권력자들이 만들지 못한 평등.
경제학자들이 실현하지 못한 평등.
종교가들이 구제하지 못한 평등.
아무도 하지 못한 평등을 유일하게 성공시킨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외로움이었다.
누구나 외롭다. 혼자다. 천만 명 몇억의 사람이 모여도
고독 앞에서는 다 같이 평등하다.
외로운 개인만이 남의 평등을 인정한다.
평등한 슬픔이 외로움이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나에게 걸어오는 이유다.
권력자도 경제인도 종교가도 이루지 못한 평등
나와 당신이 한다. 그것도 정말
외로운 한밤중 아무도 볼 수 없는 한밤중에.
2020.3.1. 이어령
< 2 >
목숨

이제 알겠니 돈으로는 달러로는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해.
내 몸 안에 있는 면역체. 나와 나 아닌 것. 그 차이를
알아내는 세포들만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이칠 수 있어.
어떤 권력자도 두렵지 않아.
어던 부귀영화도 부럽지 않아.
어떤 단절 격리도 오롭지 않아.
어떤 욕설 참언도 서럽지 않아.
마스크 한 장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성벽.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하찮은 필터 한 장 속에 가려 있음을 이제
알겠다.
그렇게 소중한 것을 안 호주머니에 넣어둔 지갑보다 가볍게
여겨왔음을 온 세상 사람들이 일시에 알았지.
텅 빈 광장. 의자만 놓여 있는 극장. 관객 없이 박수치는
유령들이 지배하는 이 거대한 극장에서 문득 생각나는
한마디 말. 내가 살아 있다는 것. 목숨. 바이러스가
인터넷보다 빠르게 가르쳐준 말.
목숨
2020.3.19.
< 3 >
보고 싶은 사람이 없다.
미치게 보고 싶은 사람이 없다.
사랑이 내 마음 속에서
소멸했다는 말이다.
기름이 마른 등잔불처럼
까맣게 탄 심지만 남아서
더는 타오르지 않는다.
타오른다는 말
타면 불꽃도 연기도 올라간다.
상승하는 것이 사랑이다.
미치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불꽃의 날개가 있었지만
이젠 땅으로 추락하는 중력
모두들 떠난 자리에 내 손바닥 하나
보고 싶은 사람이 없다.
2020.4.14
< 4 >
죽음은 열매처럼 익어간다. 처음엔 암처럼 파랗게 붙어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둥글게 자라 껍질의 빛이 달라진다.
먹어볼 수는 없지만 쓸 것이다. 떫고 아릴 것이다.
독기가 혀를 가르고 입술도 얼얼할 것인데 조금씩 조금씩
단맛이 배어나면서 빛이 달라진다.
죽음은 가을이 되고 나뭇잎이 다 떨어진 나뭇가지 위에서
노랗게 혹은 빨갛게 익어간다. 말랑말ㅇ해진 죽음에는 단맛이
들고 빛이 달라진다.
심키면 목구멍으로 넘어간다.
암흑의 빛이 온몸으로 번진다.
2020.6.15
< 5 >
삭풍보다 매서운
채찍의 아픔 속에
팽이는 얼음장 위에서도
돌아간다.
아픔이 팽이를 살린다.
채찍이 멈추면
팽이는 솔방울처럼
떨어져 죽는다.
살려면 아픔이 있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오늘 빙판위에서
나는 회전한다.
무서운 속도로.
무서운 추위로.
돌아간다.
2020.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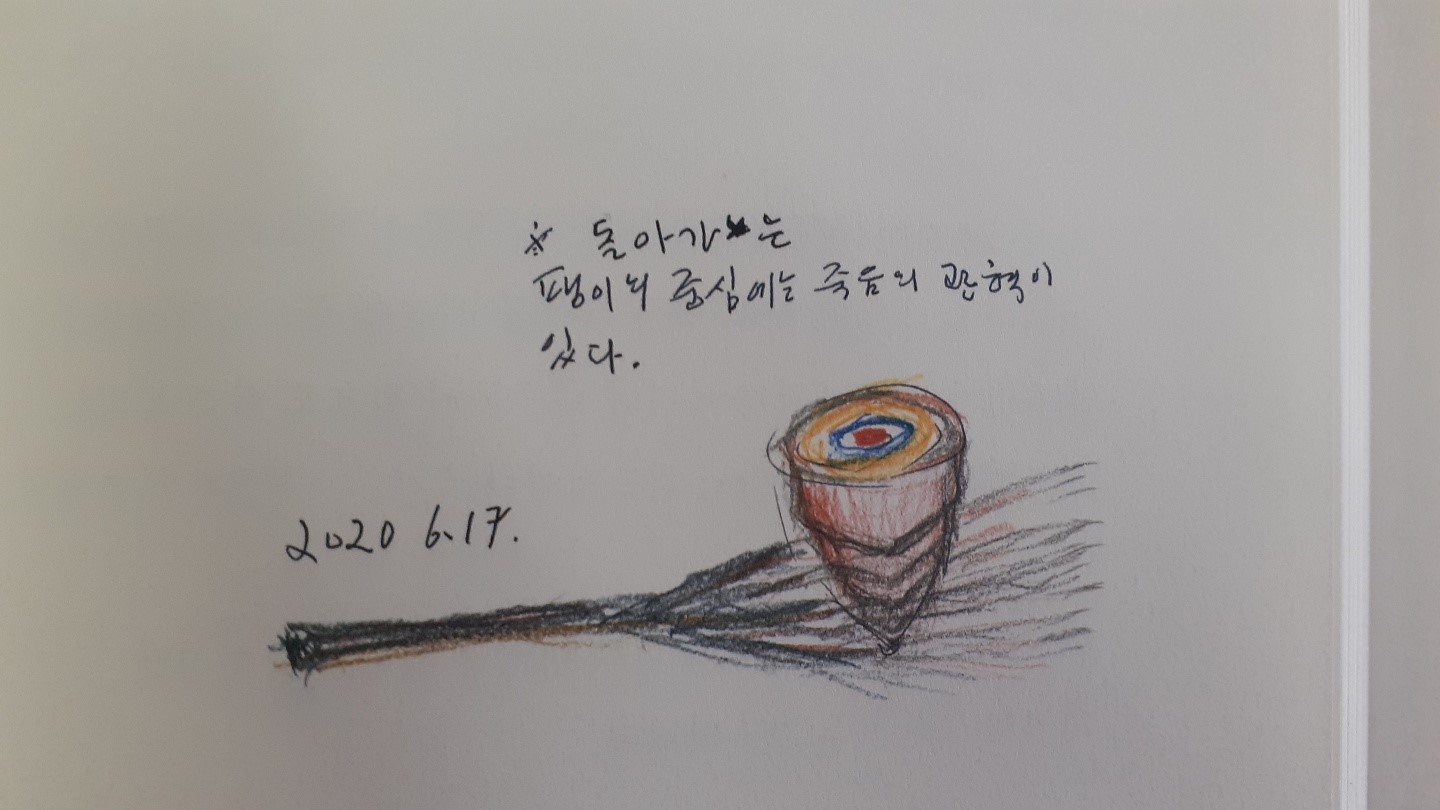
< 6 >
화폐의 가치
깊은 지식이 필요하겠는가?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안다.
돈은 전 세계 시장에 있는 물건들의
가치를 가격으로 정한다.
종류도 다르고 기능도 다른데 가격을 매겨 차등화
할 수 있나.
다이아몬드는 사막에서 길 잃은 자에게 한 방울의 물보다도
가치가 없다. 나무꾼이 당장 나무를 베는데 금도끼가 무슨
소용인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나무꾼이 필요로 하는 도끼는
금도기도 은도끼도 아닌 쇠도끼이다.
사람들은 모른다. 돈이 천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지만
물건의 가치 척도만이 아니라
고결한 정신의 척도에서도 그렇다는 것.
그래 한 가지 일러두마.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 사람을 위해 돈을 써보면 안다. 그 돈이 아깝지 않다는 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돈을 써 보면 안다. 액수가 큰 만큼 사랑도 크다.
그 돈이 아깝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숫자인 게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이 아깝지 않듯이 너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깝지 않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2020.6.27. 토요일
<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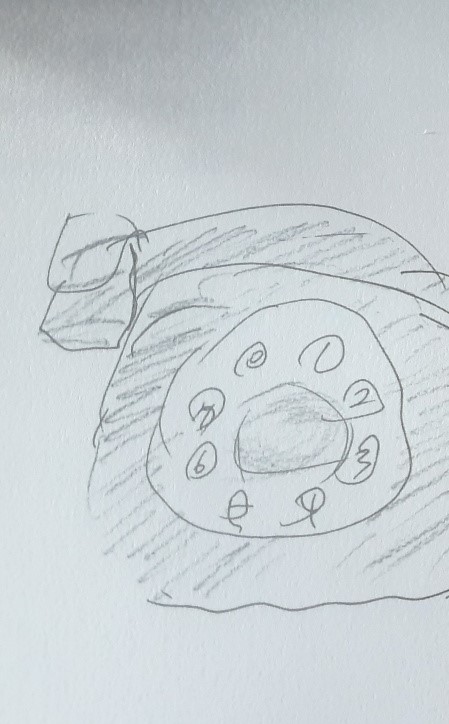
손가락으로 구멍 난 숫자를 찾아
다이얼을 돌리던 옛날 전화.
탯줄처럼 코드 선이 감긴
검은색 전화.
먼 데서 한밤중 개 짓는 소리처럼
수화기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웃음소리도 울음소리도 화난 목소리도
속삭이는 목소리도. 겨울밤 문풍지
소리.0.1.2.3.4.5.6.7.8.9.
가격표처럼 무표정한 숫자 위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분다.
손가락을 빈 구멍에 넣고 돌리면
동그란 얼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껏 떠오른
얼굴. 노래 가사처럼 떠오르는 얼굴들
< 8 >
또 만나 라는 말에
눈물 한 방울
언제 또 만날 날이 있을까?
에르메스 붉은 넥타이를 매다
눈물 한 방울
몰래 선물 놓고 간 그 사람 어디 있을까?
구두끈을 매다가
눈물 한 방울
아버지 신발에서 나던 가죽 냄새
송홧가루 날리던 뿌연 날
눈물 한 방울
나 어디 있나.
아니야 아니야 그래 그랬었지
눈물 한 방울
옛날이야기 하다가!
2020.8.19.
< 9 >
저울로 잰다.
내 몸이지만 내 몸무게를 알 수 없다.
모든 것을 숫자로 표시되어야만 믿는다.
58.4킬로그램 차가운 디지털 숫자
엊그제보다 1킬로그램이 줄었다.
70에서 60으로. 60에서 50으로 역순으로 내려가는
숫자의 끝은 어딘가?
매일 한 금씩 줄어가는 몸무게.
무엇이 가벼워진다는 건가?
죄의 무게가. 생각의 무게가. 맥동과 박동과 움직임의 무게.
목숨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것인가?
중력의 법칙과 다른 생명의 법칙은
무슨 저울로 달아야 하나.
2020.9.1.
< 10 >
많이 아프다. 아프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다.
이 신호가 멈추고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이 우리가 그처럼
두려워하는 죽음인 게다.
고통이 고마운 까닭이다. 고통이 생명의 일부라는 상식을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게다. 고통이 죽음이라고 말이다.
아니다. 아픔은 생명의 편이다. 가장 강력한 생의 시그널.
아직 햇빛을 보고 약간의 바람을 느끼고 그게 풀이거나
나무이거나 먼 데서 풍기는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픔을
통해서이다.
생명이 외로운 것이듯 아픔은 더욱 외로운 것.
고통의 무인도에서 생명의 바다를 본다.
그리고 끝없이 되풀이하는 파도의 거품들.
그 많은 죽음을 본다.
2021.5. 어버이날?
< 11 >
한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자.
한 호흡이라도 쉴 수 있을 때까지 숨 쉬자.
한 마디 말이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 말하자.
한 획이라도 글씨를 쓸 수 있을 때까지 글을 쓰자.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자.
돌멩이, 참새, 구름, 흙 어렸을 때 내가 가지고 놀던 것.
쫓아다니던 것. 물끄러미 바라다본 것.
그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었음을 알 때까지
사랑하자.
2021.8.1
< 12 >
암 선고를 받고 난 뒤로 어젯밤 처음
어머니 영정 앞에서 울었다. 통곡을 했다.
80년 전 어머니 앞에서 울던 그 울음소리다.
울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아야
암세포들이, 죽음의 입자들이 날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차돌이 되어야지. 불안, 공포 그리고 비애 앞에서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는 차돌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어제 그런데 울었다. ‘엄마 나 어떻게 해.’
울고 또 울었다. 엉엉 울었다.
2021.7.30. 금요일
< 13 >
이제는 내 손으로라도 끝내자.
참을 수 없는 밤들을 더 기다리지 말고
그 밤을 찢어버리자.
내 손으로 이제는 밤이 없도록
어느 저녁 노을을
아침 노을이라 생각하고
서쪽을 동쪽이라 생각하고
이제 엎드려 절 한 번 하고 떠나자.
지겨운 남은 밤들을 떠나자.
2021.12.8. 밤 3시
이어령 / ‘눈물 한 방울’중에서
* 독자감상 :
지난 2월 타계하신 이어령(李御寧, 1933.12.29. ~ 2022.2.26)교수님.
죽음을 앞 둔 한 지성인이 한방중에 떨어뜨렸을 눈물, 그 심정, 그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마지막 떠나면서도 아름다운 글을 남기신 고인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2022.8.19)
'어떻게 살 것인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멸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1) | 2023.03.17 |
|---|---|
| 노화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0) | 2022.09.05 |
| 신영준, 주언규 지음 ‘인생은 실전이다’중에서 (0) | 2021.10.24 |
| 어떤 죽은 이의 말/이해인 (0) | 2021.08.12 |
| 제일 좋은 것이란 없다 (0) | 2021.06.28 |